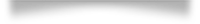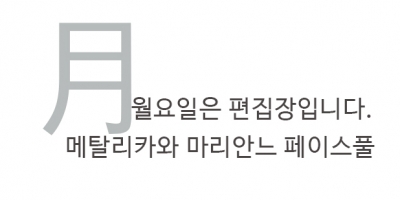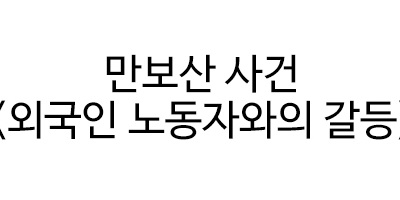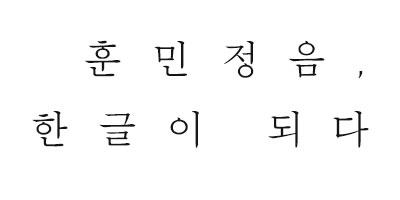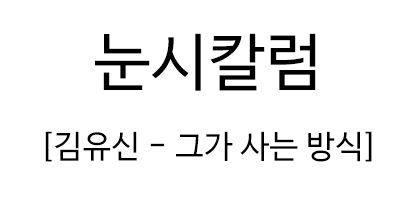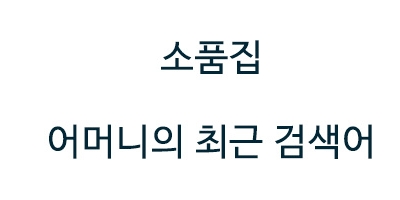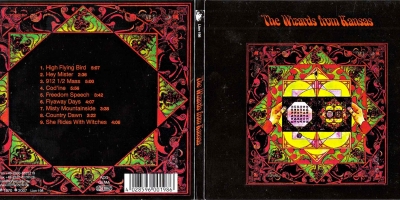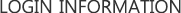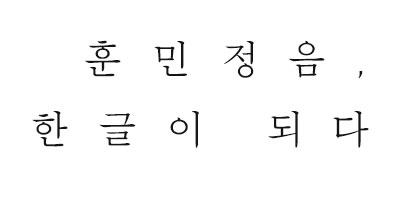
19세기 말, 조선의 주요 과제는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전근대의 중화세계관에서 벗어나 근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중국 대신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끼어있었던 점이 아쉬운 점이지만, 독립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갑오개혁으로 중국에 대한 사대를 끊으면서 한문은 국문國文의 위치에서 내려온다. 중국의 글자가 아닌 조선의 글자가 필요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세종대왕의 창제 이후 수백년간 써 왔던 언문,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래 백성들부터 양반, 왕들까지 다 알고 있는 문자, 한자에 비해 쓰고 읽기가 훨씬 편한 문자, 다른 누구도 아닌 조선의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문자였다. 이렇게 언문, 훈민정음은 창제 451년만에 국문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신문과 소설 등을 통해 한글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들을 통일해 줄 맞춤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대 지식인들이 나섰다.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은 신정국문新訂國文이라는 이름의 맞춤법 통일안을 제안했고, 유길준은 ‘조선문전’이라는 최초의 문법책을 지었다. 하지만 이들로는 한계가 있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제국에서도 1907년 국문연구소를 지어 학자들을 모았고, 맞춤법 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해산된다.

망국 후, 연구를 주도한 것이 주시경이었다. 그는 독립신문을 하면서 ‘국문동식회’를 만들었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에도 숨어 살면서 연구를 계속하였다. 1905년 ‘국문문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책을 내면서 이론을 정립하였다. 맞춤법의 보급에도 노력해서 1908년에는 ‘국어연구학회’를 만들었고 여러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강의하면서 후학을 양성한다. 이들이 이후 주시경의 뜻을 이어 맞춤법을 완성한 최현배, 김두봉 등이다.
주시경의 맞춤법은 현재 맞춤법의 토대가 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주시경은 현재 한국어와 맞지 않은 글자들을 없앴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모든 말들은 물론 중국어부터 만주어, 일본어까지 표기할 수 있는 발음기호의 성격도 강했다. 하지만 주시경은 문자는 그 민족의 언어를 가장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현재 한국어에서 쓰지 않는 글자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발음이 소멸된 ㆍ(아래아)부터 여린히읗, 순경음 등을 삭제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24자가 약간의 수정을 거쳐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다.
받침을 원래 형태에 따라 적는 ‘표의주의’ 역시 그의 유산이다. 다른 학자들은 받침은 소리나는 대로 ㄱㄴㄹㅁㅂㅅㅇ 7글자만을 쓸 것을 주장했지만 주시경은 그대로의 형태로 적을 것을 주장했다. 이것이 현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만일 ‘표음주의’가 채택이 되었다면 현재 우리는 ‘맞다, 맡다’를 모두 ‘맛다’로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맞춤법의 많은 부분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의 주장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풀어쓰기 정도이다. 수백년간 모아쓰기를 해 왔던 걸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주시경은 1914년 급체로 사망한다. 그의 나이와 업적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현재의 맞춤법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를 ‘한글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편 일제는 오구라 신페이 등 일본 학자부터 조선 학자들까지 동원해 맞춤법을 연구했고,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제정한다. 병합 후 10년간의 작업 끝에 사전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한일사전이었다. 처음 약속했던 한글 뜻풀이는 없었다. 일제에게 조선어 연구는 통치를 위한 것일 뿐이었던 것이다.
주시경의 제자들은 ‘국어연구학회’에서 이름을 바꾼 ‘조선언문회’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1921년에는 ‘조선어연구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연구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열악했다. 최남선 등 지식인들은 따로 광문회를 만들어 사전편찬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상황이 좀 나았지만 어학이 전문이라고 하기엔 부족했다. 결국 이 둘이 힘을 합쳐 사전 편찬을 결정한 것은 1929년이었다. 어학 전문가들로 구성됐던 ‘조선어연구회’는 이 사업을 주도했고, 총독부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것 대신 ‘조선어연구회’의 맞춤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때 윤치호 등은 주시경이 만든 표의주의에 맞서 표음주의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조선의 지식인들과 총독부가 표의주의에 손을 들어주면서 힘을 잃게 된다.

1931년, 조선어연구회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전 편찬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일제가 유화정책에서 조선어와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과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이광수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했고,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던 윤치호도 확실히 친일로 돌아선다. 이제 적극적 친일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조선어학회 역시 이 일로 많은 이들이 붙잡혀 갔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전 편찬을 지속했지만 일제는 트집을 잡아 조선어학회를 없애버린다. 이것이 1942년의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출판을 앞두었던 사전 역시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말로 된 사전의 꿈은 영영 잊혀질 듯 했다.
하지만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그 꿈은 다시 빛을 보게 된다. 3년간의 감옥생활도 그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 했다. 그들은 출소하자마자 사전을 찾았고, 마침내 서울역 창고에 보관돼 있던 원고를 찾게 된다. 원고지로만 2만 6천 5백여장의 분량이었다. 이를 되찾지 못 했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했을지 알 수 없다.
일제가 검열한 단어를 고치고 일본식 어휘를 삭제하고, 그들의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1947년 한글날 ‘조선말 큰 사전’ 1권이 출판된다. 1949년에는 이름을 ‘한글학회’로 고쳤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1957년 마침내 6권의 사전을 완성한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글을 한데 담은 ‘우리말 큰 사전’이다.
한글은 훈민정음의 동의어가 아니다. 훈민정음이라는 훌륭한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훈민정음을 현대의 한글로 바꾸는 것 역시 많은 학자들의 고난과 노력이 스며들어 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마음껏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이를 현대 한글로 정착시킨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학자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까만자전거] 감성충만을 돕는 음악 사용 설명서 2 (Just Wanna D...
[까만자전거] 감성충만을 돕는 음악 사용 설명서 2 (Just Wanna D...
 [Floyd의 음악이야기] 비긴어게인
[Floyd의 음악이야기] 비긴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