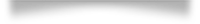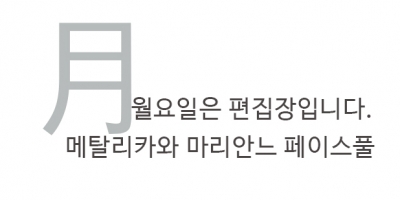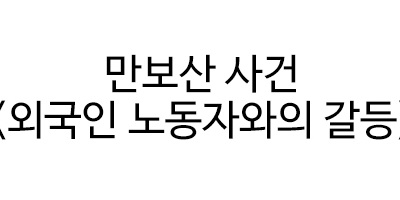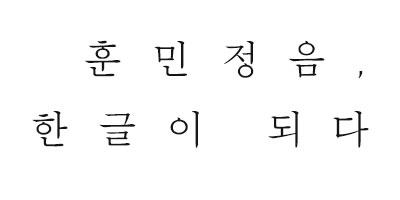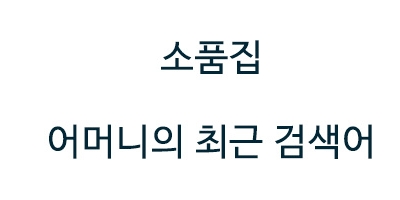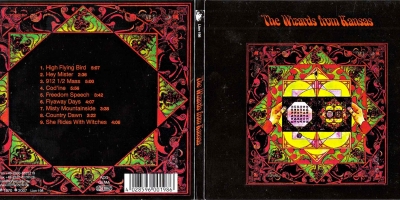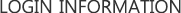여럿이 둘러앉아 TV를 볼 때면, ‘이 배우는 지난번 주말드라마에서도 악역 했는데, 또 하네. 이미지 괜찮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면, ‘저번에 세일해서 8900원이었는데 오늘은 정가대로 받네. 다른 거 사자.’ 길을 찾아 갈 때면 ‘저번에는 저쪽에서 돌아서 왔었어. 왜, 그때 누구가 혼자 집에 가기 무섭다고 해서 같이 갔었잖아. 그 날 식당 종업원이 초고추장을 누구 바지에 쏟았었잖아.’
정작 수학능력시험 때나 빛을 발할 것이지, 쓰잘머리 없이 일상에서만 신통방통한 기억력. 방송사 별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출연 배우들, 그들의 출연작품을 줄줄 꿰던 나였다. 또한 근 일주일 동안 먹은 식사와 그 가격을 맞추면서 괴상한 성취감을 느꼈고, 길 찾기에 있어선 인간 네비게이션이었다. 이런 우스꽝스런 암기력도 암기력이라고 우쭐했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나보다 하수인 자를 보면 까칠한 성격이 더욱 모나지곤 했다. 연애에 있어서는 더욱.
‘어떻게 우리 기념일을 까먹어?’, ‘내가 그 행동 싫어한다고 했잖아. 바뀌려고 노력은 하는 거야?’, ‘사랑하면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상대를 챙겨주고 싶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말하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가. 나에게 관심이 적어서 라고 생각된 데에서 그쳤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을. 기억을 못하는 그에게 왜 기억을 못하냐고 추궁을 하고, 사랑을 구걸해댔던 과거의 나. 내가 연애정신학 전문의를 취득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애불능자에서 몇 걸음 벗어난 선배로서 과거의 나를 진단해본다. 명.확.히 연애불능에 불능이었고, 그 연애가 실패로 간 것은 지당한 결과였다.
오늘, 오랜만에 나의 단골 막걸리 집을 찾았다. 서로에게 연애불능을 진단해줬던 친구 하나와 함께. 만날 때면 연애문제에 있어 실시간 고충이 많은 사람이 먼저 입을 열곤 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니었다. 열변을 토하는 친구의 막걸리 사발에 술을 따라주며, 짐짓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는 듯 끄덕거림도 곁들였다. 권태기를 진단해주며 연애에 대한 소위 썰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야, 나도 그랬어.’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만 뭔가가 부족했다. 친구도 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더욱 깊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나도 전에 했던 연애에서 똑같이 행동했어. 아니 더했을 걸? 너도 알잖아. 내가 어땠는지. 그….’ 여자들의 대화에는 단 1초의 정적도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연애를 논함에 있어서 전문의는 환자 앞에서 버벅거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자꾸 ‘그…,그….’만을 반복했다.

< 추천 PLAY ON ? 하현곤 팩토리의 ‘수신거부’ >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잊고 싶어 몸서리 쳤던 적이 있다. 흔히 연애불능자들의 이별대처법이 그러하듯 나 또한 감정이 격해지면 그에게 전화를 거는 미련하고 미련한 버릇이 있었다. 여기서 감정이라 함은 그리움, 억울함, 미련, 분노, 사랑 등 명명하기에 달려있었다. 전화를 걸면 두 번의 신호음이 간 후에 끊기던 전화. 나의 연애상담 주치의가 진단하기를, 그가 나의 전화를 수신거부 했다는 것이다. 시를 달리 하여 전화를 걸어도 두어 번 신호가 가고서 끊기는 것은 필시 수신거부를 했다는 것. 전화를 차단 당함에 있어서 친구가 선배였던 거다. 전화번호 외에도 함께 타던 버스번호, 막차시간, 옷 치수, 좋아하던 색, 좋아하던 음식, 자주하던 말버릇…. 이것들에 갇혀 지낼 때 가장 괴로웠던 질문은. ‘이것들을 잊을 수 있는 순간이 올까?’
자, 다시 막걸리 집으로 가보자. 버벅거리는 입모양으로 멈춰있는 나와 주변 상황들이 보인다. 이때, 큐!
내가 말한다. “그…. 아씨, 그…, 있잖아.”
친구가 답답했는지 “뭐?”
“그…, 내가 헤어지고서 더럽게 힘들어했던 자식!”
“아~, 그 누구누구?”
권태기인 친구에게 뼈가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서 상담 페이로 막걸리 값도 잘 받았겠다, 기분 좋게 귀가를 했다. 그럼과 동시에 잠자리에 들때까지, 아니 들어서도 계속 입에 맴도는 말 하나. 바로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듯싶은데, 나는 왜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단순히 내 기억력이 감퇴한 걸까, 이유가 궁금했다. ‘월요일 점심 돈까스, 화요일은 부대찌개, 수요일은 닭갈비, 목요일은 바쁜 관계로 식사 패스. 제 작년 친구에게 받은 생일선물은 절친을 끊고 싶을 정도로 유치한 알람시계. 그래서 작년에는 정확히 한 달 전부터 받고 싶은 선물리스트를 넘겼지.’ 기억력 테스트용 질문을 던지는 족족 곧바로 답이 나왔다. 그렇다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게서 그가 흐릿해진 걸까. 떠올리기 싫어서 말을 않던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 석 자가 내 마음 속 캄캄한 방에 놓여있었던 걸까.
성격이 급한 탓에 연인이건 친구건 가족이건 불문하고 상대가 ‘그…, 그….’라고 꺼낼 때면 답답함에 인상부터 쓰곤 했다. 그러던 내가 기뻐하고 있다. 다른 이유도 아닌 내가 답답한 사람이 되어서다. 질색하던 답답함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유익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러면서 문득 그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베개의 사방을 축축하게 적시며 궁금하던 그의 안부가 아닌, 쿨 워터 향수를 뿌리고서 미련을 애써 숨기며 궁금해하던 그의 안부가 아닌, 진정으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며 궁금한 그의 안부였다.
오늘은 내가 답답함을 대하는 자세 내지는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였지만, 이따금 내가 격하게 고갯짓을 했던 것들이 살랑살랑 내 울타리를 넘어올 때가 있다. 그것은 솜뭉치 같은 강아지의 꼬리처럼 앙증맞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하다. 홀로 방에 누워 엄마 미소로 마음 속 훈훈함을 양성하다, 문득 내 추접한 감정들을 써내려 갔던 노트가 생각났다. 오늘의 감정도 한줄 끄적거리고 싶어서. 무엇을 하기위해 인터넷을 켰는지 잊고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노트를 집으니 쓰고 싶던 문구들을 뒤로 하고 그 첫장부터 읽게 되었다. 종이가 울어있다. 몇 개월 전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써내려갔던 미숙한 글들. 그 중에서 지금 내 기분과 얼추 어울리는 듯 한 글을 발견했다. 당연히 이 노트의 모든 글에서 오글거림은 필수 항목이다.
‘타인이 보기에 행복한 사람처럼 무리 속에서 깔깔 눈물 고이게 웃는 것보다 마음 속 잔잔히 홀로 기뻐하고 형태 없는 미소를 짓는 것이 더한 행복감을 주는 줄 그땐 몰랐다. 내가 내 마음을 미미하게 울려나가야 기쁨도 맞추어 울려 들어오는 줄 미처 몰랐다. 모두 다 생각하기에 달렸다. 내가 생각을 바꾸기에 달렸다. 고집스레 고개 저어지던 것도 마음을 1도만 따스하게 하면 어느새 감사함으로 나를 맑게 마주하고 있다. 내 키와 발 치수는 이미 성장을 멈추었지만 이렇게 나의 내면은 아직도 꿈틀꿈틀 커나가려고 작은 움직임에 한창이다.’
글 : 이효영(채널168 에디터)
그림 : 오경진(채널168 디자인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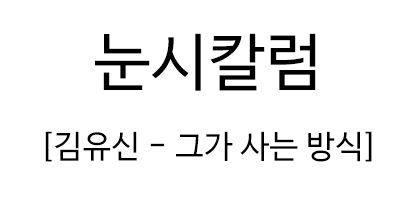 눈시칼럼 - [김유신 - 그가 사는 방식]
눈시칼럼 - [김유신 - 그가 사는 방식]
 [눈시칼럼] 성웅 - 충무공 이순신
[눈시칼럼] 성웅 - 충무공 이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