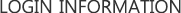추억 속의 산재처리
-2-
그는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잊히고 있는 중이다. 초가 시간을 태우듯이 그도 헤어진 여자 친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촛불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려하자 그는 고개를 들어 북한산 쪽을 바라보았다. 산도 흐렸다. 구름에 가린 산의 모습 아래로 광화문이 보였다. 광화문이라고 써진 한자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 편액 말고 낯익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그는 시위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목에는 피켓이 걸려있었다. 처음 보는 이름의 회사에 대해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재빨리 친구의 온몸을 살펴보았다. 친구는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촛불을 내려놓고 친구에게 다가갔다.
“선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잘 지냈어?”
선재는 오랜만에 만난 그를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그동안 외로웠거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나도 나와 봤어.”
“산재라니 어디 다쳤어? 심각 한 거야? 병에 걸린 거야?”
선재는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었다.
“마음이 아파. 머리도”
“무슨 소리야? 정확하게 말해봐. 아니다. 이렇게 서서 말할 만큼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지?”
선재는 악수를 청했다. 선재의 손은 차가웠다. 서늘한 그 손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선재는 그의 수첩을 받아 전화번호를 하나 적었다. 그리고 선재는 비척비척 광장의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선재는 곧 어둠으로 덩어리진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선재의 뒷모습에서 어떠한 감정도 읽어 낼 수 없었다.
그는 선재의 사연을 추측해 보기 시작했다. 그와 선재는 중학교 시절 동창이었다. 그가 알던 중학교 시절 선재는 조용하고,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조용히 창가 뒷자리에 앉아 낮이나 밤이나 연습장에 낙서를 했다. 선재에게 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자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선재는 옆집에 사는 소꿉친구와 사귀고 있었다. 항상 그의 연습장에는 그 여자 친구의 얼굴이 가득했다.
그런 선재와 그가 친해졌던 계기는 촛불 때문이었다. 선재와 그의 담임선생님 별명은 삼겹살이었다. 삼겹살 선생님은 방학 때면 반 아이들과 학교에서 1박2일 야영을 하였다. 그 야영은 항상 고백의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밤 12시에 다들 촛불을 하나씩 들고 모여서 잘못했던 일을 고백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촛불로 옆에 있는 촛불을 켜고, 다음 촛불을 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 있었던 일은 다들 자연스럽게 서로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담임선생님은 지난번 봄 소풍에서 보물찾기 시간에 보물을 숨기지 않고 찾으라고 했던 일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촛불은 느릿느릿하게 옆으로 움직였다.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일, 우유를 친구 자리에 쏟고 모른 척 한일, 수업시간에 방귀를 뀌고서 짝꿍에게 뒤집어씌운 일등 시답지 않은 고백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선재의 차례가 되었다.
선재는 한참이나 말을 하지 않고 촛불만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선재는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선생님은 물론 아무도 선재를 붙잡지 않았다. 선재는 요 며칠 동안 좀 이상했다. 학교에도 지각하고 수업시간에도 엎드려만 있었다. 담임선생님이 선재를 불러서 혼을 내도 바뀌지 않고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거나 양호실에서 잠을 잤다. 그럼에도 학교는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는 괜히 선재가 걱정돼 뒤따라갔다. 선재에게서 위태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선재와 지금 앉아있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밤 1시에 가까워진 학교는 고요했다. 그는 선재의 심장 뛰는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선재는 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선재는 흐느끼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선재는 자신이 소꿉친구를 만졌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선재네 집에 놀러온 소꿉친구는 선재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선재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뒤를 돌아보았다. 소꿉친구의 얼굴을 비추는 햇볕이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열대어의 비늘처럼 반짝였다. 선재는 가만히 그 빛을 쓰다듬었다. 그 빛은 창살 모양을 따라서 말아 올라간 허벅지에도 비추었다. 선재는 말아 올라간 치맛자락을 내려 주었다. 선재는 손에 닿는 그 포근함과 부드러움에 잠시 빠졌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소꿉친구가 눈을 뜨고 말았다. 소꿉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선재의 집에서 뛰쳐나가 버렸다. 햇볕만 굳어버린 선재의 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선재는 도망친 소꿉친구를 아직도 만날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선재는 그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그는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가고 둘은 그렇게 비밀을 나누었다. 선재의 남는 시간을 그가 채워주었다. 그가 보기에 선재는 참 이상한 친구였다.
미술시간에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들’이라는 그림을 OTP파일로 보게 되었다. 보자기를 뒤집어 쓴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은 어두운 색채로 채색되어 그냥 보기에도 우울했다. 그는 그 그림을 보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키스를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혀 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머니조차 그의 서울 생활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대부분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기만 했다. 그가 보기에 평범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 순종적이라는 점이었다. 같이 사는 파트너라기보다 빚을 진 채무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서울에서 큰 세상을 보기를 원했다. 아버지가 결정하고 어머니가 끄덕이는 순간이 그가 대구가 싫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선재는 그 그림을 보며 연습장에 이렇게 썼다. ‘둘이 콘돔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아.’ ‘너 콘돔 본적 있어?’ ‘아니!!!’ 그러나 선재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소꿉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았다. 그도 그 소꿉친구가 그 이후로 먼 동네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선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선재는 별 반응이 없었다. 다만 그날부터 선재는 수업을 갑자기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끈덕진 설득에 못 이겨 대구로 내려가기로 결정 했다. 이제 그의 방치된 인생은 아버지가 끌어 줄 것이다. 그는 그의 인생을 흐름에 맡기기로 하였다. 아직 그 흐름을 만나지 못한 대통령을 위해서 그는 꾸준히 광장에 나갔다. 대구로 가면 이런 집회는 이제 영영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선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제 삼일 뒤면 대구로 내려가야 했다. 광장에서도 선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고시원에는 전화가 없었다. 그는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공중전화를 들렀다. 선재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선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라는 것을 알고
“내일 정오까지 우리 중학교 그 느티나무 밑으로 와줘”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째서 그곳일까. 고시원 침대에 누운 그는 선재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영화 실미도의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다시 재생되고 다시 재생되었다. 그는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싶었다. 그러나 영화를 함께 본 여자 친구의 얼굴도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란 항상 인간을 배신한다. 잊고 싶은 기억은 온 힘을 다해 눌러도 수영장의 기판처럼 다시 떠올라서 괴롭힌다. 그러나 기억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써도 어둠만 생각난다. 그는 임용고시 시험시간에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릴 수 없었던 도표를 생각했다. 지금은 생생한 그 도표가 시험시간에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기억의 배신을 생생하게 느끼는 밤이었다. 그렇게 그는 떠올리고 싶은 옛 여자 친구의 얼굴과 떠올리기 싫은 도표 사이에서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그가 잠이 깬 시간은 어느덧 아침 11시도 넘은 시간이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헐레벌떡 전철역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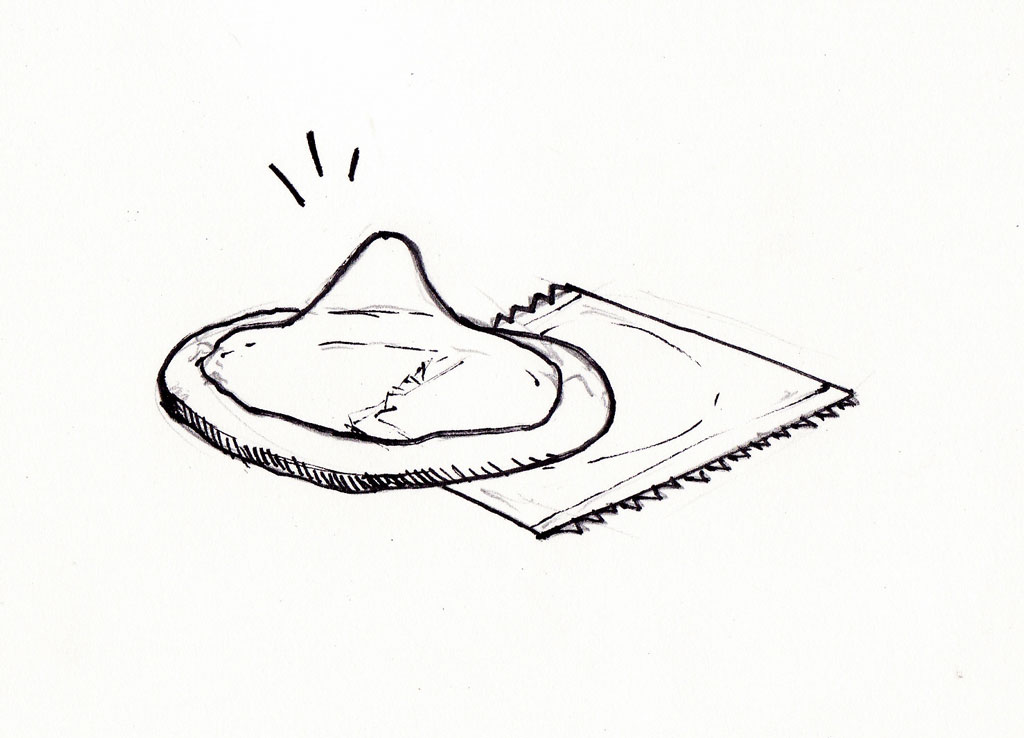
朴我(자유기고가)









 03.[돈비호갱 리턴즈] 그 가을, 식성이 분다.
03.[돈비호갱 리턴즈] 그 가을, 식성이 분다.
 13. [공연사용설명서]트랜스포머 30주년 오리지널 아트워크전 & ...
13. [공연사용설명서]트랜스포머 30주년 오리지널 아트워크전 & ...